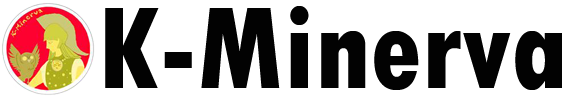[G-50] 확대되는 공공부채와 예산적자로 인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된 캐나다
북미의 천연자원 부국 캐나다,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찾아야, 오일샌드 다량 매장으로 석유산업 발전 가능성 높아져
캐나다는 세계 2위의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맺어진 국가다. 1763년 프랑스와 영국의 파리조약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지로서 운영되다가 1867년 자치령으로서 독립했다. 거대한 국토에 비해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있지만 북쪽으로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있다.
1951년 정식 국명인 캐나다를 지정하고서 의료, 교육, 사회 복지, 경제 부문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퀘벡주의 불어권 지역과의 마찰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시장이 거품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암시하고 있다.
▶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일 정도로 의존 심해,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더 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 광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미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1989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1994년 멕시코까지 합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70%가 넘고 석유, 가스, 우라늄이라는 주요 자원의 공급국가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앨버타 지역의 오일샌드 매장이 확인되면서 석유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셰일가스 유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석유매장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기침체도 장기간 우려되면서 경제적 성장동력이 길을 잃은 상태다.
이러한 캐나다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캐나다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240억 달러(약 26조5200억원)가 증가한 1조5180억 달러(약 1677조원)로 세계 14위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당시 약 1700억 달러(약 187조8800억원)가 급감했지만 이후 오일샌드, 셰일유전, 전반적인 석유산업의 발전과 미국과의 무역증대로 다시 GDP가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1.7%에서 2013년에 1.6%로 하락했고 세계 154위에 위치해있다. 2014년 마지막 분기에 2.6%를 기록하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듯 보이고 있지만 유가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재정적인 부문에서 타격을 주고 있다. 2008~20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이후 0.0~4.0%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55.8%), 정부소비(21.6%), 고정자본 투자(24.6%), 재고 투자(0.2%)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497억 달러(약 54조9200억원)다. 2012년 무역적자 534억 달러(약 59조100억원)에서 37억 달러(약 4조800억원)가 감소한 수치다. 2014년 수출입 모두 감소했으며 동시에 적자도 189억 달러(약 20조8800억원)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지난 6년 만에 공장가동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멕시코 등이다. 미국과의 교역에 전체의 50% 이상이 치중돼있으며 그 외에 NAFTA의 멕시코와 식민지를 받았던 영국, 아시아에 중국이 있다. 최근 광우병으로 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한국까지 이슈화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86.3%로 1조5480억 달러(약 1710조원)이며 2012년 대비 0.9% 증가해 세계 23위다. 2003년 GPD의 76.6%였던 공공부채가 2008년까지 71.1%까지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대됐다. 문제는 공공부채 이외에도 민간경제에 흐르는 주식, 펀드,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거품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6878억 달러(약 760조1500억원)며 지출은 7408억 달러(약 818조73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으로 규모는 GDP의 2.9%인 530억 달러(약 58조5700억원)다. 국내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대비 평가절하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도매무역은 감소하고 있어 예산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부지역의 오일샌드, 셰일, 석유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다시 경기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균형예산을 책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3480만 명 중에서 1908만 명으로 54.8%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37위의 인구와 32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08년 기준 농업(2.0%), 산업(19.0%), 서비스(79.0%)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4만3100달러(약 4760만원)로 19위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율 수치는 2008년 기준 9.4%다.
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3년 7.1%로 0.2%P 하락했다. 2014년부터 7.0% 미만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5년 1월 6.6%를 기록했다. 정규직의 고용보다는 계약직 3만5000명의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다. 실업문제와 더불어 최근 철도공사 측의 파업으로 인해 정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 및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밀, 보리, 유채, 담배, 과일, 야채, 유제품, 물고기, 임산물 등이 있다. 대규모 면적에 비해 농경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전체 중 7.6%에 불과하다. 주로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생산해 공급한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운송장비, 화학, 광물, 식품, 목재 및 종이제품, 생선제품,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광물이 풍부한 국가이기에 자원부문 산업이 대부분이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0%로 2012년 대비 0.5%P 하락했다. 2014년 2.0~2.5%를 등락하면서 물가를 유지해오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의 경제대국이 1.0% 미만의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캐나다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2014년 12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5%로 가솔린 가경의 하락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에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극복해야 경제 안정 가능
현재 캐나다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경기, 무역수지 적자행진, 수출입 감소와 유가의 하락, 석유산업의 발전과 투자잠재력 향상, 공장가동률 최저치로 도소매 라인 하락세, 광우병으로 인한 육류시장 타격, 공공부채의 확대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한 에너지사업 발전, 국내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상승률의 조정,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낮은 기준금리 유지, 6~7%대의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활성화, 파업과 임금 및 복지 개선을 외치는 근로자들, 북미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 유통업체 손실액 증가로 구조조정 단행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농업, 에너지, 제조업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농업은 밀과 곡물로서는 세계 최대 농산물시장 중 하나다.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최대교역국인 미국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약 7%에 불과한 농경지이지만 수출용 생산량에는 충분한 환경이다. 알버타와 사스카츄완 주의 경우 농경지 면적은 전체의 70%를 차지해 특화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업 역시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전 국토의 약 40%가 삼림으로 덮여 있다. 목재와 펄프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침엽수도 많아 가구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다. 수산업 또한 세계 최대 생선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선의 경우 가공 및 처리를 통해 2차 부산물로서 수출하기도 한다.
둘째, 에너지 산업으로서 석유, 셰일, 천연가스, 친환경 산업이 있다. 여기에 오일샌드 지역이 발견되면서 석유산업은 붐을 일으켰고 2014년 중반까지 1배럴 당 100달러였던 시대 동안 큰 수익을 창출했다. 북부지역의 셰일유전의 생산량도 점점 증가시켜 미국과 석유정책을 함께 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유가가 반토막으로 깍이면서 석유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결국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렸지만 채산성을 확보한 친환경 사업은 없었다.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 및 투자자금도 약 10년 동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우라늄, 철광석, 알루미늄, 니켈 등의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있어 광산업과 더불어 관련 제조업부문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국제금속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광산업체들의 수익성이 차감되기도 했다.
셋째, 제조업으로서 국가 기반산업의 2차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세계대전 이후 미국, 멕시코 등과 북아메리카 제조업 생산단지를 신증설하기 시작했다. 광물의 가공처리 산업, 식품가공,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생산, 항공우주산업 등이 주요 부문이다. 원유 역시 화학공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통신, IT,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의 서비스부문 제조업은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항공주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의 상주로 인해 헬기부터 운항용 항공기, 위성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가 캐나다의 제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주목할 만한 산업이 딱히 없다. 오일샌드에 대한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 원유생산의 저렴한 단가와 대량 생산을 꿈꾸는 투자자들은 많지만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다. 정치적인 갈등과 시장경기의 침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현재 캐나다 경제의 현주소다.
미국이라는 큰 경제대국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나다 배릭골드의 금광 전경(출처 : 홈페이지)
캐나다는 세계 2위의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맺어진 국가다. 1763년 프랑스와 영국의 파리조약으로 인해 영국의 식민지로서 운영되다가 1867년 자치령으로서 독립했다. 거대한 국토에 비해 국민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있지만 북쪽으로 다량의 천연자원이 매장돼있다.
1951년 정식 국명인 캐나다를 지정하고서 의료, 교육, 사회 복지, 경제 부문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긴 하나 여전히 퀘벡주의 불어권 지역과의 마찰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부동산시장이 거품이 형성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암시하고 있다.
▶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일 정도로 의존 심해, 제조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더 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 광업 및 서비스 부문의 성장은 미국과 동시에 이뤄졌다. 1989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1994년 멕시코까지 합세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북아메리카 지역의 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교역이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70%가 넘고 석유, 가스, 우라늄이라는 주요 자원의 공급국가이기도 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후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앨버타 지역의 오일샌드 매장이 확인되면서 석유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셰일가스 유전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에 이어 석유매장량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금융 부문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국의 경기침체도 장기간 우려되면서 경제적 성장동력이 길을 잃은 상태다.
이러한 캐나다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캐나다의 2013년 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240억 달러(약 26조5200억원)가 증가한 1조5180억 달러(약 1677조원)로 세계 14위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0년 당시 약 1700억 달러(약 187조8800억원)가 급감했지만 이후 오일샌드, 셰일유전, 전반적인 석유산업의 발전과 미국과의 무역증대로 다시 GDP가 증가했다.
실질성장률은 2012년 1.7%에서 2013년에 1.6%로 하락했고 세계 154위에 위치해있다. 2014년 마지막 분기에 2.6%를 기록하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되는 듯 보이고 있지만 유가의 하락이 미치는 영향은 재정적인 부문에서 타격을 주고 있다. 2008~2010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이후 0.0~4.0% 사이에서 등락하고 있다.
구성 비율은 가계소비(55.8%), 정부소비(21.6%), 고정자본 투자(24.6%), 재고 투자(0.2%)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적자는 497억 달러(약 54조9200억원)다. 2012년 무역적자 534억 달러(약 59조100억원)에서 37억 달러(약 4조800억원)가 감소한 수치다. 2014년 수출입 모두 감소했으며 동시에 적자도 189억 달러(약 20조8800억원)로 절반 이상 축소됐다. 지난 6년 만에 공장가동률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미국, 중국, 영국, 멕시코 등이다. 미국과의 교역에 전체의 50% 이상이 치중돼있으며 그 외에 NAFTA의 멕시코와 식민지를 받았던 영국, 아시아에 중국이 있다. 최근 광우병으로 인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한국까지 이슈화되고 있다.
셋째, 공공부채는 2013년 GDP의 86.3%로 1조5480억 달러(약 1710조원)이며 2012년 대비 0.9% 증가해 세계 23위다. 2003년 GPD의 76.6%였던 공공부채가 2008년까지 71.1%까지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대됐다. 문제는 공공부채 이외에도 민간경제에 흐르는 주식, 펀드, 금융상품 등에서 발생한 거품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예산은 2013년 집행이 6878억 달러(약 760조1500억원)며 지출은 7408억 달러(약 818조7300억원)다. 집행액수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예산으로 규모는 GDP의 2.9%인 530억 달러(약 58조5700억원)다. 국내 통화가치는 미국 달러대비 평가절하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으며 도매무역은 감소하고 있어 예산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부지역의 오일샌드, 셰일, 석유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다시 경기회복을 노리고 있으며 2015년에는 이러한 영향의 결과로 균형예산을 책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인구 약 3480만 명 중에서 1908만 명으로 54.8%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37위의 인구와 32위의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노동비율은 2008년 기준 농업(2.0%), 산업(19.0%), 서비스(79.0%)로 구성됐다. 2013년 기준 구매력지수 1인당 GDP도 4만3100달러(약 4760만원)로 19위를 차지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율 수치는 2008년 기준 9.4%다.
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3년 7.1%로 0.2%P 하락했다. 2014년부터 7.0% 미만으로 실업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015년 1월 6.6%를 기록했다. 정규직의 고용보다는 계약직 3만5000명의 고용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다. 실업문제와 더불어 최근 철도공사 측의 파업으로 인해 정부와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임금과 근로시간 및 복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밀, 보리, 유채, 담배, 과일, 야채, 유제품, 물고기, 임산물 등이 있다. 대규모 면적에 비해 농경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전체 중 7.6%에 불과하다. 주로 밀과 보리 등의 곡물을 생산해 공급한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운송장비, 화학, 광물, 식품, 목재 및 종이제품, 생선제품,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다. 광물이 풍부한 국가이기에 자원부문 산업이 대부분이다.
물가상승률은 2013년 1.0%로 2012년 대비 0.5%P 하락했다. 2014년 2.0~2.5%를 등락하면서 물가를 유지해오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의 경제대국이 1.0% 미만의 디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캐나다도 이를 피할 수 없었다. 2014년 12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1.5%로 가솔린 가경의 하락으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에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극복해야 경제 안정 가능
현재 캐나다의 주요 경제현안 이슈를 살펴보면 2008년 이후 회복되지 않은 경기, 무역수지 적자행진, 수출입 감소와 유가의 하락, 석유산업의 발전과 투자잠재력 향상, 공장가동률 최저치로 도소매 라인 하락세, 광우병으로 인한 육류시장 타격, 공공부채의 확대와 균형예산 편성을 위한 에너지사업 발전, 국내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상승률의 조정, 소비 활성화를 위한 낮은 기준금리 유지, 6~7%대의 실업률과 비정규직의 활성화, 파업과 임금 및 복지 개선을 외치는 근로자들, 북미 최대 바이오매스 발전소 운영, 유통업체 손실액 증가로 구조조정 단행 등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농업, 에너지, 제조업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했다.
첫째, 농업은 밀과 곡물로서는 세계 최대 농산물시장 중 하나다. 지리적인 이점과 더불어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최대교역국인 미국에 대량 수출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약 7%에 불과한 농경지이지만 수출용 생산량에는 충분한 환경이다. 알버타와 사스카츄완 주의 경우 농경지 면적은 전체의 70%를 차지해 특화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업 역시 발달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전 국토의 약 40%가 삼림으로 덮여 있다. 목재와 펄프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으며 침엽수도 많아 가구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다. 수산업 또한 세계 최대 생선수출국 중 하나로 미국을 비롯한 영국,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전체 수산물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생선의 경우 가공 및 처리를 통해 2차 부산물로서 수출하기도 한다.
둘째, 에너지 산업으로서 석유, 셰일, 천연가스, 친환경 산업이 있다. 여기에 오일샌드 지역이 발견되면서 석유산업은 붐을 일으켰고 2014년 중반까지 1배럴 당 100달러였던 시대 동안 큰 수익을 창출했다. 북부지역의 셰일유전의 생산량도 점점 증가시켜 미국과 석유정책을 함께 했지만 지난 7개월 동안 유가가 반토막으로 깍이면서 석유관련 산업에도 악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결국 대체에너지 산업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투자자들이 눈길을 돌렸지만 채산성을 확보한 친환경 사업은 없었다. 오일샌드에 대한 개발 및 투자자금도 약 10년 동안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우라늄, 철광석, 알루미늄, 니켈 등의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돼있어 광산업과 더불어 관련 제조업부문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최근 국제금속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광산업체들의 수익성이 차감되기도 했다.
셋째, 제조업으로서 국가 기반산업의 2차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세계대전 이후 미국, 멕시코 등과 북아메리카 제조업 생산단지를 신증설하기 시작했다. 광물의 가공처리 산업, 식품가공, 자동차 부품 및 완제품 생산, 항공우주산업 등이 주요 부문이다. 원유 역시 화학공정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통신, IT,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등의 서비스부문 제조업은 최근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항공주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업의 상주로 인해 헬기부터 운항용 항공기, 위성 등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처럼 높은 교육수준의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가 캐나다의 제조업 경쟁력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주목할 만한 산업이 딱히 없다. 오일샌드에 대한 중국 및 기타 국가들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 원유생산의 저렴한 단가와 대량 생산을 꿈꾸는 투자자들은 많지만 여전히 시간과 비용이 더 필요하다. 정치적인 갈등과 시장경기의 침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은 현재 캐나다 경제의 현주소다.
미국이라는 큰 경제대국을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 경기침체에 빠진 미국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캐나다 배릭골드의 금광 전경(출처 :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